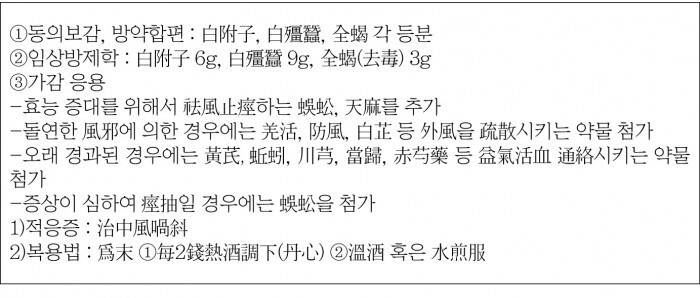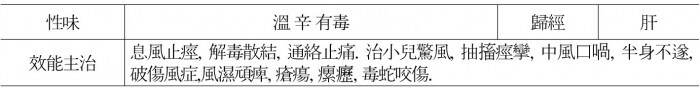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10) - 반신불수 중기 中期(비기허 脾氣虛)에는 거풍제습탕 ‘활용’ 처방관련 자료/한약처방해설(주영승 교수)2021. 11. 9. 09:03
[거풍제습탕 祛風除濕湯의 처방의미]
명 明나라의 공정현 龔廷賢이 저술한
만병회춘 萬病回春에서 제시된 처방으로,
풍습 風濕을 제거해준다는(祛風除濕) 의미의 이름이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서 해당 처방을
중풍 中風의 오른쪽 반신불수 半身不遂에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풍제습탕 祛風除濕湯의 구성]

도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1)반신불수 半身不遂의 다양한 증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처방(四君子湯, 二陳湯)을 비롯하여,
처방의미에 맞게 청열조습 淸熱燥濕, 보혈 補血, 거담 祛痰,
거풍지통 祛風止痛 등의 구성약물이 추가된 복방 複方이다.
관련 기타 문헌에서도 처방기록은 모두 동일하다.
2)한편 祛痰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본 처방은 도담탕 導痰湯(동의보감-世醫得效方),
청열도담탕 淸熱導痰湯, 거풍도담탕 祛風導痰湯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정리되어진다.

위의 구성 한약재
(첨가약물로서 반하 半夏 독성에 대한
상외 相畏의 배합인 생강편 生薑片 포함)에 대하여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기 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13 寒性2 凉性2 平性2 로서,
대부분 온성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미 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辛味12 苦味9 甘味7 淡味1 등으로 되어 있다.
3)귀경 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脾12(胃8) 肺11(大腸4) 肝7(膽2) 心5(小腸1,心包1) 腎3(膀胱3) 등으로
주로 비폐간경 脾肺肝經에 집중되어 있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益藥4(補氣藥3,補血藥1) 解表藥4 理氣藥3
淸熱藥3 化痰藥2 利水藥1 芳香性化濕藥1
理血藥1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방 내용 분석 및 정리
1) 온성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본 처방은 寒閉의 기본증상인 ‘面淸 身凉 苔白 脈遲’의 상태로서
溫開法과 祛寒行氣藥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寒性과 凉性약물은
모두 君藥이 아닌 보조약으로서 反佐의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黃連 黃芩의 경우 酒炒를 하여 寒性을 감약시키고 있다.
2) 辛味 苦味 甘味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
‘辛味는 發散行氣, 苦味는 淸熱降火燥濕,
甘味는 滋補和中緩急’에 부합하는 것으로,
辛味는 혈액순환 촉진을 통한 發汗을,
苦味는 불필요한 부종인 濕에 대처한 通便을,
甘味는 虛弱에 대비한 것으로
주로 君藥으로 사용되어 補에 대한 집중 배려를 하고 있다.
3) 歸經에서, 脾肺肝經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歸經論의 대전제인
‘脾主四末 脾惡濕, 肺主氣 , 肝主風’의 내용에 부합한다.
기타 ‘心主血 心藏神, 腎主水 膀胱主一身之表’의 내용으로
보완될 수 있겠다.
한의학적으로 오른쪽 半身不遂를
氣虛와 痰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氣虛에 대한 대처로 후천의 水穀之氣를 관장(脾爲運化之器)하며
四肢의 운동장애(脾主四末)와 관련이 있는
脾臟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痰濁에 대하여는 祛痰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련이 있는 肺臟(肺主氣, 肺爲貯痰之器)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뇌신경계통질환에 대한 肝臟(肝主風)과
血行장애개선에 대한 心臟(心主血)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4)효능에서, 補益藥(補氣藥3과 補血藥1),
解表藥, 理氣藥, 淸熱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쓰지 못하는 것은 瘓이라 하니--
氣虛하면 痰火가 오른쪽으로 流注하여 右瘓이 된다…
治法은 右瘓에는 마땅히 補氣하고 겸하여 痰을 흩어야 하니…’ 의
오른쪽 半身不遂(右瘓)의 치료원칙과 약한 發汗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리하자면 본 처방은 전통한방의
우측반신불수 右側半身不遂의 원인에 따른 치법 治法인
보기 補氣(四君子湯-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와
화담 化痰(二陳湯-半夏 陳皮 赤茯苓 甘草 및 桔梗)에
기본조건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1)이중 보기 補氣에 대한 보완으로,
특히 후천의 水穀의 정기인 補脾氣를 확실히 보좌하기 위해서
脾惡濕의 원리에 맞춘 온성거위습 溫性去胃濕(蒼朮)
한성거중초습열 寒性去中焦濕熱(黃連),
순비기 順脾氣(陳皮 枳殼 烏藥)약물을 배치하고 있다.
2)화담 化痰에 대한 複方차원의 분석을 하면,
기본처방인 二陳湯(半夏 陳皮 赤茯苓 甘草)
-> 導痰湯(二陳湯加 南星 枳殼)
->淸熱導痰湯(導痰湯加 黃芩 黃連)과
祛風導痰湯(導痰湯加 羌活 白朮)의 순서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中風痰厥에 化痰을 위해서
위의 모든 처방의 적응증인
化痰 淸濕熱 止痛 除濕의 방법이 망라된 처방이다.
3)한편 기타증상의 호전을 위한 방안으로,
發散止痛(羌活 防風 白芷),
補血活血(當歸 川芎 赤芍藥),
寒性의 去上焦濕熱(黃芩)을 배려한
標本兼施의 처방인 것이다.
①이중 發散止痛의 경우를 설명하면,
본 처방은 의학입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痛症이 있는 것은 實症이니 우선 二陳湯을 쓰고∼
痛症이 없는 것은 虛症이니∼右瘓에는 四君子湯을 쓰는데∼’의
원칙에 부합되는 처방으로 해석된다
②寒性약물인 黃連과 黃芩은
대부분의 溫性약물로 구성된 본 처방의 反佐의 배합이면서도,
酒炒를 하여 寒性의 감약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甘草의 炙 역시 溫性의 추가로 정리된다.
3. 거풍제습탕 祛風除濕湯의 실체
이상 최종적으로 반신불수 半身不遂에 응용되는
거풍제습탕 祛風除濕湯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하면,
1)중풍후유증인 반신불스 半身不遂가 기간이 경과하여
허증 虛症의 모습, 구체적으로는 기허 氣虛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기 補氣 특히 보비기 補脾氣에 집중된 처방이고,
중풍 中風의 원인인
담탁 痰濁에 대하여도 거담 祛痰을 동시 목표로 하는 처방으로서,
반신불수 半身不遂 후유증의 중기 中期
특히 비기허 脾氣虛에 응용될 수 있는 처방으로 정리된다.
2)아울러 부수증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타약물이 배합되었고,
이러한 배합 역시 오른쪽 반신불수 半身不遂의 원인이라고 보았던
기허 氣虛와 담탁 痰濁에 대처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본 처방중 유독성인 반하 半夏의 수치 修治는 필수적이다.

출처: 한의신문
주영승 교수(우석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처방관련 자료 > 한약처방해설(주영승 교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12) - 갈근탕, 구안와사 口眼喎斜 초기 열증 熱症 처방 (0) | 2021.12.21 |
|---|---|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11) - 허약성 생리통에 사용하는 처방 ‘대영전 大營煎’ (0) | 2021.11.23 |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9) - 구안와사(口眼喎斜) 회복기 허증(虛症) 통용처방, 가미보익탕 (0) | 2021.10.29 |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8) - 월경 전 생리통에 사용하는 ‘청열조혈탕’ (0) | 2021.10.15 |
|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7) - 반신불수 中期(血虛)에는 가감윤조탕 ‘활용’ (0) | 2021.10.05 |